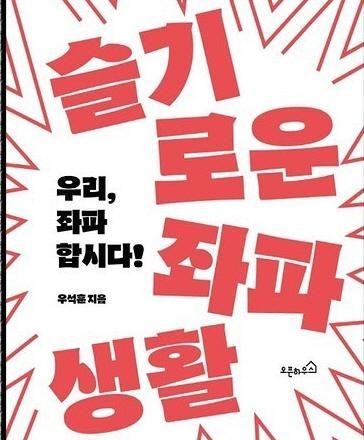눈 오는 날은 어린이집 가는 것도 큰 일이다. 어쨌든 애들은 눈 오면 좋아한다. '펄펄 눈이 옵니다..' 우리 집에서 듣던 노래가, 다른 집에서도 들려온다. 노래 하나 참 기가 막히게 만들었다는 생각이 문득. 외국에서 눈 올 때, 이렇게 특징적으로 들리는 노래가 잘 기억나지 않는다. 우리나라에서는 어느 동네 가든, 눈만 오면.
모레는 큰 애 어린이집 졸업식이다. 나는 광주에서 자고 오느라고, 졸업식은 못 간다. 졸업식 이후 입학식 때까지, 통합보육 한다고 어린이집 오면 봐주기는 한다고 한다. 그래도 돌 되기 전까지, 나랑 나랑 땡땡이 친 거 말고는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어린이집 갔다.
학교 들어갈 때까지는, 그냥 내가 데리고 있기로 했다. 나는 내 일 하고, 자기는 혼자 놀고, 그런 연습을 좀 하기로. 둘째는 혼자 잘 노는데, 큰 애는 아직도 혼자 잘 못 논다. 결혼하고도 9년만에 태어난 애라, 조금만 울어도 다들 죽어라고 뛰어갔다. 둘째는 방법이 없어서 혼자 방치하던 시간도 길었다.
큰 애랑 단짝으로 친했던 친구는 사립학교로 간다. 집도 그 근처로 이사간다는 것 같다. 이 동네 주로 가는 사립학교가 두 개가 있다. 하나는 여전히 박 터지는 것 같고, 또 하나는 미달이다. 프랑스 계열 학교로 보내라는 사람도 좀 있었는데, 총 맞았나.. 우리 말 잘 하는 것도 앞으로는 큰 능력이 될 사회가 올 것 같다. 형편 되는대로 열심히 살면 되는 거지, 목숨 걸고 기이한 짓을 하는 것.. 식민지 시절이나 그렇게 하는 거 아닌가 싶다.
파리에 있을 때, 아랍 친구들은 물론 아프리카 친구들이 주변에 많았다. jeune africaine, 뭐 그런 청년 아프리카 연대 비슷한 잡지 내는 친구도 있었고. 우리 식으로 치면, 집 수십 채 있는 건물주, 그야말로 족장 아들들이 파리로 유학을 온다. 안 그런 친구들도 있다. 혁명적인 아프리카 청년들이 어떻게 연대해야 사회적 구조를 바꿀 것인가, 그런 고민하는 친구들도 많다. 그 두 그룹의 친구들이 다 있었다. 대학원 때 지도교수가 아프리카 경제학으로는 프랑스의 최고 권위자 중의 한 명이었다. 자연스럽게 아프리카의 미래에 대해서 생각해보게 되었다.
청년들이 헬조선이라고 부르는 지금의 한국을 그 시절의 눈으로 생각해보면, 족장들 자식이 모국으로 유학오는 것.. 다를 게 없다. 사람 보는 눈은 다 거기서 거기라서, 외국에서도 이게 뭔지, 조금씩은 생각하게 된다.
이랬던 한 시대도 언젠가 변화할 거라고 생각한다. 중남미에도 소위 시카고 보이즈, 시카고로 유학간 정치 유력자의 2세들이 힘 쓰던 시기가 있기는 했다. 그런 시대도 좀 변하는 것 같다.
협상 다니던 시절, 친하게 지냈던 멕시코 외교관이 있었다. 유능했다. 꼭 인디오 전통복장을 입고 협상장에 나왔다. 멕시코도 변하고 있었다. 세계화가 되면 세상이 막 섞이고 그럴 것 같지만, 전통에 대한 강조가 묘하게 강화된다. 우리도 그런 시기로 갈까? 어른들은 안 입는 한복이 어린이집 다니는 애들에게는 필수 요소가 되었다. 일년에 몇 번은 꼭 입는다.
하여간 한국의 지배층이 하는 자녀 교육은, 좌파든 우파든, 선진국 보다는 아프리카나 멕시코와 가까왔다. 변화가 올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