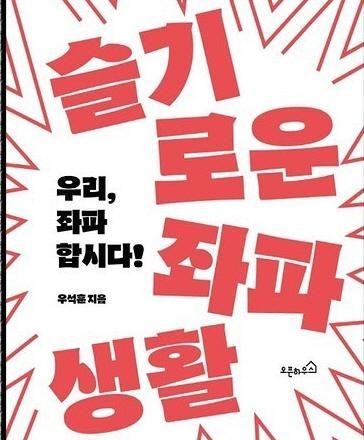일본 문화에 익숙하지 않은 나에게 다카하타 이사오는 여전히 미스테리에 가득한 인물이다. 내가 알고 있는 것은 그가 빨간머리 앤의 감독이었고, 미야자키 하야오와 함께 콤비로 오랫동안 활동했다는 것, 그리고 스튜디오 지브리의 두 개의 축 중에 한 명이었다는 사실 정도이다. 그리고 미야자키 하야오보다 더 좌파라는 지적이 종종 있는데, 실제로 어떤 사람인지는 아직은 잘 모른다.
그의 에니메이션 중에는 <폼포코 너구리 대작전>은 마음이 울적해질 때마다 보고는 하는, 그야말로 '내 인생의 에니메이션 탑 파이브'에 들어가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울적할 때에는 이토 준지의 공포 콜렉션을 주로 본다. 오랫동안 내 감성에 제일 잘 맞는 사람은, 여전히 이토 준지이다.)
88년에 나온 에니메이션 <반딧불이의 묘>를 본지는 몇 주 안된다.
(요즘 내가 하도 깝깝해하고 있으니까, 아내가 하자센터에서 영화 몇 개를 빌려다주었는데, 그 중에 끼어있었다.)
일본 에니메이션 중에는 반전을 메시지로 하고 있는 것들이 많은데, 때때로 과하게, 때때로 허황되게 그런 정서들이 그려지는 것 같다. 가장 허황되게 반전을 그린 것은 실사영화로 나왔던 <캐산> 정도로 기억된다.
<반딧불의 묘>는 그야마로 극사실주의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두 남매가 전쟁 한 가운데에서 굶어죽어가는 현실을 그려냈는데, 다카하타 이사오는 이 에니메이션이야말로 영화가 할 수 없는, 에니메이션만이 보여줄 수 있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 같다. 다섯살짜리 애의 연기가 이럴 수는 없지 않은가?
(어쨌든 나중에 이 원작은 다시 TV 시리즈로도 만들어졌다고 알고 있는데, 일본의 TV 시리즈는, 뭐 구해서 볼 가능성이 거의 없다.)
'드로푸스'라는 모티브, 정확히는 '드로푸스 통'이라는 모티브가 한 가운데 들어가 있는데, 드라마 <서울 1945>에도 드로푸스가 모티브로 등장한다. (전후 관계로 보아, 에니메이션이 먼저가 아닐까 하는 생각도 살짝 들었다.)
어쨌든 내가 본 영화나 에니메이션 중에서 이렇게 사실적으로 영양실조로 굶어죽어가는 것을 주 축으로 하고 있는 얘기가 있나 싶게, 얘기는 슬프고 장면들은 아름답다.
몇 달 전에 야스쿠니 신사에 간 적이 있는데, 몇 시간에 걸쳐 박물관까지 꼼꼼하게 돌아보았고, 일부분이지만 문제가 된다는 바로 그 홍보영 영화도 보았었다. 마지막 장면은 놀이터에서 대화하고 있는 청소년들을 보여주고 있었고, 배경 음악은 비트가 강한 힙합으로 마무리되고 있었다. 할아버지들만 공유하고 있는 야스쿠니의 정신을 젊은 층에게도 널리 알리기 위한 장치들을 배치한 거이라고 평가를 받고 있다는데, 만약 한쪽 끝에 야스쿠니 신사의 박물관에서 틀어주는 홍보영 영화가 있다면, 또 다른 한 쪽 편에는 다카하타 이사오의 <반딧불의 묘>가 있지 않을까 한다. 어쨌든 일본이 태평양 전쟁을 이해하는 두 개의 눈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다.
하여간 <반딧불의 묘>가 나에게 인상적으로 남은 것은, 영화 자체의 요소라기 보다는 영화 바깥 쪽의 얘기들이다.
다음 주부터는 그동안 모아놨던 자료들과 학생들의 글을 모아서 <혁명은 이렇게 조용히>라는, 20대 당사자 운동에 대한 내 나름의 생각을 정리하는 책 작업을 시작한다. 원래는 지난 2월에 하려고 했던 것인데, 연재와 강연, 그리고 얘기치 않았던 방중 프로그램에 치여서 이렇게 몇 달 밀린 셈이다.
이번 주까지는 생태경제학 시리즈 1, 2권을 어떻게든 1차 마무리하고, 다음 작업으로 넘어가려고 하는데, 이 다음 작업이 바로 이 책인 셈이다.
아마 부제가 이렇게 될 것 같지는 않은데, 실제로 이 책의 부제로 내가 달고 싶은 것은, "밥은 먹고 다니냐?"라는, 한 때 송강호가 했던 대사이다. <살인의 추억>이라는 영화의 맥락과는 상관없이, 어쨌든 이 대사가 이 순간에는 딱 적합하다 싶다는 생각을 몇 번 했었는데, "밥을 먹지 못하면"이라는 생각의 다음 단계로 이어지는 시퀀스가 딱 머리 속에는 <반딧불의 묘>로 자리를 잡게 되었다.
그만큼 에니메이션은 강렬하다. 더 무서운 것은, 이 남매의 얘기가 어느 정도는 사실이라는 점이다.
그야말로 경제 위기 속에서 별다른 안전판 없이 개별적으로 세상에 내밀린 사람들, 밥은 먹고 다니는지 모르겠다.
조직론에 관한 분석을 할 때, 내가 자주 쓰는 분석틀 중의 하나가 균질성과 이질성이라는 개념인데 - 원래는 경제 주체에 대한 두 가지 접근법에서 따온 것이다 - , 명박 정부의 가장 큰 문제점 역시 이러한 균질성의 문제로 종종 해석한다. 늙탱이들이 자기들끼리 모여서 세상을 보니, 도대체 이 밖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알 턱이 있나.
그래도 너희들은 밥은 먹지 않느냐? 주로 지금의 20대들에게 사람들이 하는 말이기는 한데, 이 말이 정말인지는 잘 모르겠다.
약간의 극단의 경우이기는 하지만, 전쟁, 구조, 그리고 진짜로 개별적 굶주림 같은 몇 개의 키워드들이 반딧불이 번쩍거리는 환상적 장면들 속으로 묘하게 연결이 된다.
(90년대 후반, 삼성에서 반딧불을 그룹 차원에서 이미지로 민 적이 있었다. 약간 어이가 없으면서도 잘 해보라고 했던 적이 있는데, 그 때 반딧불 얘기하던 사람들은 삼성 내에서 지금쯤은 어디에들 있는지, 살짝 궁금하기도 하다. 반딧불이 돌아올 수 있는 생태계를 위해서 삼성이 생태계 보호에 앞장서겠다는 얘기였는데, 10년도 안된 지금, 그 흔적을 찾아보기가 어렵다.)
'영화 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 하류인생과 김민선 (2) | 2009.09.11 |
|---|---|
| 인디 스페이스와 다큐 (11) | 2009.09.10 |
| 코코 샤넬 (8) | 2009.09.06 |
| 쿡 티비, 그리고 <타짜> (12) | 2009.08.25 |
| 카모메 식당 (9) | 2009.06.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