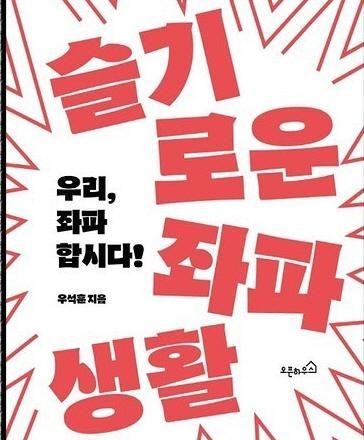prescribed burning 혹은 controlled burn이라는 행정 용어가 있다. 우리나라 정서상 이런 걸 하지 못하니까 산림청에서는 thinning이라는 부르는 간벌을 억지로 한다. 너무 예산이 적게 잡혀서 간벌도 너무 소규모고, 무엇보다 간벌한 나무를 가지고 내려오는 인건비가 없어서 그냥 두고 온다. 결국 포유류들이 움직이는 길목을 막아서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키게 된다.
우리나라에서 인공산불과 간벌이 필요하게 된 것은 벌써 90년대의 일이다. 그 때부터 임도라는 얘기를 엄청나게 했다. 결국 토건의 연장선에서 임도만 잔뜩 만들고, 다른 건 안 했다. 임도 만들 때 명분이 산불 나면 불 끈다고.. 별 효과 없다는 거 알면서도 임도는 또 죽어라고들 만들었다. 결국 헬기 더 사야 한다는..
처음에는 산불을 등산객이 담배 피워서, 담배에다가 죽어라고 이유를 돌렸다. 이걸 막으니까 이제는 한전에 발화 이유를 돌린다. 물론 직접적 발화 이유는 담배일수도 있고, 또 다른 부주의한 일일 수도 있고, 전기선이나 배전 계통일 수도 있다. 이런 걸 죽어라고 막으면?
이게 전형적인 행정 편의주의다. 극상을 지난 숲은, 자기들끼리 발화하기 좋은 기름 잔뜩 든 잎을 피워내기 시작한다. 우리나라에 가장 많은 나무 중의 하나인 졸참나무 등 참무두들도 그렇다. 그리고 이런 화재를 자신의 우점종 전략으로 채택하는 나무들도 많다. 대표적인 게, 코알라들의 먹이로 잘 알려진 유카리투스. 산불도 나무들에게는 생존의 전략이다.
극상에 달한 숲의 관리 그것도 처음부터 단순 바이오량 개념으로 마구잡이로 '나무를 심자'고 했던 60~70년대의 조림의 결과가 또 다른 형태의 관리로 넘어가야 했던 시기가 90년대 중반쯤이다. 조림 후 30년쯤..
미국의 많은 국립공원에서 prescribed burning을 하게 된 사회적 논의는, 곧 2020년대가 되는 한국에도 전혀 없다.
정부가 얼마나 잘 대응을 했느냐.. 사람들이 엄청 감탄한다. 이 정부 만쉐이..
1930~1940년대 미국의 대응이 이랬다. 클라이막스인 숲의 관리는 여전히 어려운 일이지만, 한전 잡아라, 심지어 도로를 엄청 잘 만든 고속도로 '인프라' 덕분에 전국의 소방차가 잘 모여서 큰 일을 막았다. 이게 언론이냐? 박수 부대지.
1차적으로는 맞는 얘기 같지만, 숲이 뭔지, 숲 생태계의 특징이 뭔지 전혀 이해하지 못한 비과학적 접근이 아닌가 싶다.
이런 식으로 해봐야, 해마다 산불만 더 많이 나고, 더 크게 난다. 담배불 조심하고, 전선마다 두껍게 피복을 둘러도, 결국은 작은 낙뢰 혹은 바람에 의한 나뭇잎 마찰로 인한 자연 발화, 극상에 달한 숲의 화재는 막을 수 없다. 그게 숲 생태계의 극상 관리의 자연적 전략이기도 하다.
사람들은 그럴 수 있다고 치자. 재해관리 주관방송은인 kbs는 도대체 뭐 하는 덴가 싶다. 평소에 기관 보도자료 읽던 받아쓰기 언론은, 산불에 대해서는 구경하기 언론의 모습으로 바뀌었다.
받아쓰기나, 구경하기나.. 이게 왜 이런겨? 질문하는 언론을 못 봤다.
바람이 불고, 불씨가 튀었다.. 불행한 비행청소년이 야구 배트로 누군가를 때렸다. 왜 그 청소년이 그런 일을 벌이게 되었는지, 어쩌다 이 지경까지 되었는지, 그런 얘기가 필요하다.
한국의 언론은.. 야구 배트의 재질과 스펙, 그래서 그게 얼마나 위험한 물건인가, 그리고 왜 소년이 갑자기 빡 돌았나, 그 얘기만 하고 있다.
언제까지 이럴겨?
'잠시 생각을'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문학 분야, 연 소득.. (0) | 2019.04.10 |
|---|---|
| 새만금 어민들 기자회견.. (0) | 2019.04.09 |
| 강원도 산불 보도, 언론 유감.. (0) | 2019.04.06 |
| 서울시 아파트 층고 제한 재검토.. (0) | 2019.04.02 |
| 진보누리 시절에 대한 회상 (0) | 2019.04.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