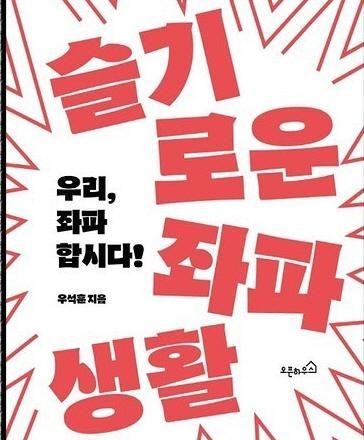예전에 공부할 때 연극성(theatralite)라는 개념이 유행했었다. 어렵게 생각하면 한없이 어려운 개념이고, 쉽게 생각하면 아무 것도 아닌 개념이다.
푸코의 <말과 사물>의 연장선에서 생각해보면..
사춘기가 과연 예전에도 있었을까?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다. 사춘기가 현대적 현상이라는 거다. 근대가 출현하기 전에, 인간이라는 개념도 약했고, 인문과학, 그런 개념 자체가 아예 없었다. 그러니까 어린이 개념도 없고. 어린이는 약한 사람, 불완전한 사람, 그런 거였던 것 같다. 인간에 대한 접근이나 개념 자체가 약하니까 당연히 어린이도 개념이 없고. 교육도 지금과는 접근 자체가 다르고. 그러니까 청소년이라는 개념도 없었던. 청소년이라는 개념이 없으니까 그 청소년기라고 해서 뭔가 특별하게 다르게 취급하지도 않고.
우리의 역사를 생각해보면, 사실 청소년기에 들어가기도 전에 벌써 결혼을 했고, 아빠가 되어 있거나 엄마가 되어있거나. 사춘기? 그게 뭔데? 불과 100년 전만 해도 한국 사람들은 그랬을 거다. 그러면 사춘기는? 이게 자연적 현상이냐, 사회적 현상이냐? 보기에 따라서 양 쪽 다 가능한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절대적인 생리현상인 것만은 아닐 것이다. 그러니까 사춘기가 이제는 중2에 온다고 하기도 하고, 초등학교 5학년 때 온다고 하기도 하고. 사춘기야말로 사회현상이기도 하고, 개념 현상이기도 하다. 나는 사춘기가 없었던 것 같다. 반항은 학교 죽어도 안 간다던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지금까지.. 반항을 안 한 적이 없으니까 특별히 더 한 시기도 없다.
연극성은 이런 생각의 연장이다. 자기가 자신의 삶을 무대의 주인공처럼 생각한다는.. 이게 보기에 따라서는 20세기 현상이기도 하다. 대가족 시절에는 자신의 삶을 주도적으로 생각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재산이고 뭐고, 아무 것도 안 주는 차남들에게서나 생겨나는 현상일 수도 있다.
더 올라가면 과연 인간, 아니 남자가 언제부터 허리띠를 쓰기 시작했는가? 최소한 그 때부터는 자신을 장식하고 꾸미기 시작한 거니까. 생각보다 늦다.
소비적 주체의 등장, 아마도 그런 과시적 효과를 베블렌이 분석한 게 19세기 후반이니까 그 정도에는 중산층에서도 어느 정도 형성이 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다.
20세기, 드디어 생산의 주체이자, 소비의 주체인 개인에 대한 생각이 확고하게 자리를 잡게 된다. 물론 그 이전에도 스스로 자신의 삶이 주인이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있엇겠지만, 귀족이거나 선각자 정도 되지 않았을까. 하여간 ‘연극성’이라는 얘기는 이런 얘기다.
원래 그랬던 것은 아닐지라도, 우리 모두에게 자신은 자신만의 극장에서 모두가 주인공이다. 인생을 하나의 거대한 연극처럼 생각하고, 모두 거기에서 자신만의 연극을 하게 된다. 그게 삶이다.
이 얘기가 너무 재밌었다. 실제로 이 얘기로 박사 논문을 쓸 생각도 있었는데, 현실이 그렇게 되지는 않았다. 정권이 우파로 바뀌면서 지도교수가 정년 이후 명예교수에서 밀려났다. 그리고 나는 현실과 좀 타협을 했다.
연극성, 이 얘기 자체가 엄청나게 새롭거나 그런 거는 아니다. 자기 인생에 자신이 주인공이라는 거, 너무 당연한 거 아냐? 그리고 남이야 뭐라고 하든, 작당한 판타지를 가지고 사는 거 아냐? 어차피 삶은 연극 같은 것인데?
그렇기는 한데, 이 얘기가 나한테 영향을 안 준 것은 아니다. 아무리 하찮아 보이거나 별 거 없어 보이는 사람도, 다 자신의 의식 속에서는 주인공들이다. 그가 착각을 하는 게 아니라, 원래 그런 것이다.
기획을 하거나 마케팅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이 흔히 양아치 짓을 하게 되는 일이 벌어진다. 사람을 숫자로만 보는 것이다. 물론 관객수, 독자수, 이런 건 다 숫자로 나온다. 시청률, 열독률, 이런 tv와 신문 같은 것도 주요 지표가 숫자로 나온다. 하다못해 유튜브도 카운터 숫자와 독자수, 이렇게 숫자로 나온다. 그래서 머리 수 세는 논리에 익숙해진다. 이런 게 그 자체로 나쁜 건 아니다. 하다 못해 생태학의 기본도 머리 수 세기다. 포퓰레이션, 모집단의 개체수를 세는 것으로부터 생태학이 시작된다. 그런데 머리 수가 모든 것이 되고, 머리 수만으로 생각을 하게 되면? 이러면 딱 양아치다.
그 숫자로 대표되는 모집단 속에서 한 명 한 명의 연극 주인공들이 존재한다는 생각을 잃으면, 그게 바로 양아치 아닌가? 생태학은 머리 수 세는 데에 끝나지 않는다. 그건 기본 데이터일 뿐, 그 속에서 생명과 생명 그리고 구조와의 관계를 구성해가는 것이 생태학 작업이다. 머리 수만 세고, 그걸 돈으로만 연결하는 것, 그건 양아치다. 그런 양아치성을 끝까지 몰고 가면, 미세먼지가 중요하니까 원전을 늘리자, 이런 이상한 얘기가 나온다. 환원해서는 안 될 것을 환원하게 된다.
이와는 정반대의 경우가, 주인공들끼리의 연합체 같은 것으로 세상을 인식하는 것. 나도 주인공, 너도 주인공, 우리 모두 주인공, ‘우리끼리만’. ‘스카이 캐슬’ 현상 같은 것으로 보면 된다. 예전 경기고 나온 할아버지들이 이런 짓을 잘 했다. 얘도 경기고, 쟤도 경기고. 노회찬도 경기고 아녀? 이런 참, 뭐라 할 수도 없고. 노회찬은 학교나 학번 따지고, 나이 따지는 거 진짜 싫어했다. 어쨌든 노회찬도 경기고 나왔으니까 그 자리까지 간 거여, 참 뭐라 할 말이 없었다. 그 경기고들이 대통령은 한 번도 못 만들었다. 얼마나 억울해들 하시는지. 그래서 이회창을 죽어라고 밀었다. 이회창 대통령 떨어질 때, 얼마나 꼬시던지! 게다가 상고출신 대통령 되는 순간, 진짜로 꼬셨다. 그래, 이게 시대 정신이야!
한 명 한 명의 연극 무대를 들여다보고, 그 사람이 주인공으로 살아가는 세상을 연극으로 보는 것, 물론 나도 잘 못 한다. 그래도 세상을 그렇게 보려고 한다. 한 사람 한 사람, 기회가 되는 대로 그렇게 삶의 하나로서 재구성 해보려는 노력은 한다.
책의 저자가 되는 것은, 독자 한 명 한 명을 연극의 주인공으로 인식하기로 마음을 먹는 것과 같다. 제일 개쓰레기 같은 작가는 책 판매 부수로 자신의 독자들을 이해하는 사람이다. 그건, 인간도 아니다. 양아치도 아니고, 스카이캐슬도 아니고, 그냥 개쓰레기다. 책을 못 쓸 수도 있고, 재미 없게 쓸 수도 있고, 쓰다 보면 틀린 내용을 쓸 수도 있다. 살다 보면 그런 일이 생긴다. 그러나 독자를 그냥 머리 숫자로만 이해하는 사람은, 책의 저자로서 출발점이 안 된 개쓰레기다. 3류 신문사 편집국장 같은 얘기일 뿐이다.
책이란 임시로 펼쳐진 연극 무대 같은 것이다. 책을 만드는 사람들은 그 연극 무대와 조명, 장치들을 설치하는 사람에 불과하다. 책 쓴 사람이 주인공 아니냐고? 오 노! 연극 장치의 설치자 중의 한 명일 뿐이다.
책은 독자가 주인공이 되는 것이다. 책 만드는 놈을 욕하든, 책 쓴 놈을 욕하든, 자기 마음대로 평가하든, 주인공 마음이다. 읽는 사람이 임시로 무대 이에 올라가는 주인공, 그런 게 책이다. 비슷한 표현으로 ‘여행 가이드’라는 말이 있다. 마찬가지다. 여행은 주인공이 하는 것이다. 가이드는 그 코스를 도와주거나 약간의 설명을 덧붙일 뿐이다.
책만 그런 건 아니다. 만드는 모든 일이 다 그렇다. 연극에는 희로애락이 다 들어가 있고, 삶의 모든 요소가 들어가 있다. 그걸 이해하는 게 만드는 일의 출발점이다. 내 물건을 누가 쓰는지, 어떻게 쓰는지, 그 의미가 뭔지, 그걸 아는 게 만드는 일의 시작이다. 그걸 모르고 하면? 본인도 힘들고, 남들도 힘든 일이 언젠가 벌어지게 된다.
'책에 대한 단상' 카테고리의 다른 글
| 광주의 직장 민주주의 조례.. (3) | 2019.02.20 |
|---|---|
| 시대유감 (0) | 2019.02.17 |
| 해탈은 아직 멀다.. (1) | 2019.02.12 |
| 하루 2시간 일하기.. (2) | 2019.02.05 |
| 그 나물에 그 밥.. (0) | 2019.02.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