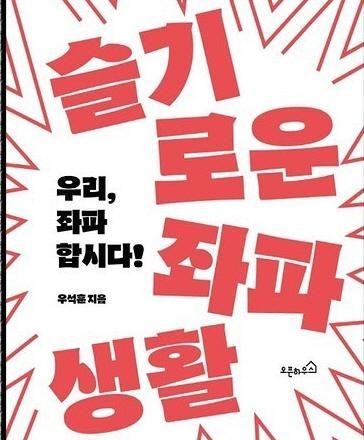애 보면서 매 순간이 힘들지만, 가장 힘들었던 때를 생각해보면..
작년 딱 요맘 때, 애들 어린이집 옮길 때였다. 둘을 동시에 옮길 수가 없어서, 큰 애가 한 달 먼저 갔다. 형이 먼저 가 있어야 동생의 대기 번호에 우선권이 주어져서 그래도 따라 옮겨갈 수 있다는 거다.
뭔 미친 짓인가 싶었다. 육아행정이 거지 같지만, 그 거지 같은 일의 끝판왕 정도 된다.
그 때 큰 애가 "어린이집 가기 싫다"고 하는 일이 생겼고, 1년이 지난 지금도 아직 회복되지 않았다.
나는 일단 몸이 너무 힘들었다. 아침에 꽤 먼 어린이집부터 집 근처까지, 그야말로 셔틀을 도는데, 진짜 죽을 맛 같았다. 같은 짓을 오후에 한 번 더 해야 한다. 방법 없다.
그 때 너무 힘들어서 차 잠깐 세워놓고 쉴 때였다. 박원순이 어머니들 만나서 82년생 김지영 무슨, 뭐 그런 토론회 비슷한 걸 한다는 얘기였다. 젠장, 눈물이 핑 돌았다.
힘들다, 이거 너무 힘들다..
나는 68년생 아빠다. 그날만큼은 나도 너무 힘들어서 차 안에서 펑펑 울었다.
당장 육아관련 무슨무슨 본부 같은 거 만들고, 내가 나서서 본부장 하겠다고 손 들 생각이 머리 끝까지 올랐다. 돈 말고도 간단한 행정 조치만으로 지금보다 2~3배는 편하게 만들 자신이 있었다.
그렇지만 담배 한 대 피우고, 제정신이 돌아왔다. 혹시라도 내가 뭐 한다고 나설까봐 견제가 몇 년째 장난 아니다. 한 때는 동지였고, 동료였던 사람들인데, 내가 움직일 만한 공간은 다 막아놓고 있다.
이제는? 마찬가지다.
그냥 애 키우면서 지내는 게 이제 2년이 넘었다. 이제는 애 보는 게 힘들어서 아무 일도 못한다.
내년이면 큰 애가 초등학교에 들어간다. 아내가 3월 한달은 육아휴직 신청을 했다. 방법이 없다. 그리고 둘째가 초등학교 2학년 끝날 때쯤까지, 나는 매일 매일이 거의 같은 삶을 살게 된다.
그래도 나는 건강이 형편없는 거 빼면, 사정은 좀 낫다.
<82년생 김지영>은 그런 삶에 관한 얘기다.
바로 소설을 읽어야지 하고 생각을 했는데, 정작 내가 소설을 읽을 수 있게 된 건, 그 후로도 1년이 지난 다음이다. 책을 조금씩은 읽는데, 소설을 읽을 여유까지 생기지는 않는다.
여유.. 하긴, 그딴 건 없다. 그냥 다른 일을 밀어치고 하는 거지.
소설 <82년생 김지영>은 따로 서문이 없어서 1장을 읽었는데.. 햐, 1장 읽다가 눈물 날 뻔 했다. 소설로는 별로라고 개소리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걸로 아는데, 그야말로 애 안 키워본 할배 같은 소리 아닌가 싶다.
할배들, 이것들 정말 사람도 아니라는 생각이 든 순간이 있었다.
아주아주 유명한 할배들이다. tv에도 나오고, 책에도 나오고, 에 또 틈틈이 신문 인터뷰도 나오는, 겁나 유명한 할배들이다. 한국의 지성, 이런급 사람들이다.
"애 보는 게 그렇게 어려워?"
네, 그렇지요, 뭐. 얼버무리고 대답하고 얘기를 하는데, 진짜 애 보는 게 '눈으로' 애만 보면 되는 건 줄 알고 있는 할배들..
조국과 민족을 위해서 니가 뭘 좀 해야지, 애만 보고 있냐고 지랄들이다. 그 정도면 그냥 넘어갈려고 했다.
"조선 시대에 훌륭한 사람들은 다 처가에서 컸는데.."
애들은 처가집에 맡기고, 대충 자기들 따가리짓이나 마저 해달라는 건데..
솔직히 패 죽이고 싶었다.
나도 여력이 있으면 <48년생 할배들>, 그런 거 써보고 싶다는 생각이.
그리고 <매운 인생 달달하게 달달하게>, 책의 준비를 시작했다. 나는 그런 할배로 늙어가고 싶지 않다는..
애 키우다 보면, 영혼이 산화된다.
소설은 그렇게 영혼이 산화된 어느 젊은 엄마에 대한 이야기이다.
'남들은 모르지.. > 책 서문 읽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서문 읽기 18] 살아야겠다 - 김탁환 (0) | 2019.11.08 |
|---|---|
| [서문 읽기 17] 상속의 역사 - 백승종 (1) | 2019.01.22 |
| 책 서문 읽기의 부수적 효과, 1등 되기, 별 의미는 없어도.. (0) | 2019.01.17 |
| [서문 읽기 15] save the cat! (0) | 2019.01.17 |
| [서문 읽기 14] 주적은 불평등이다 - 이정전 (2) | 2019.01.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