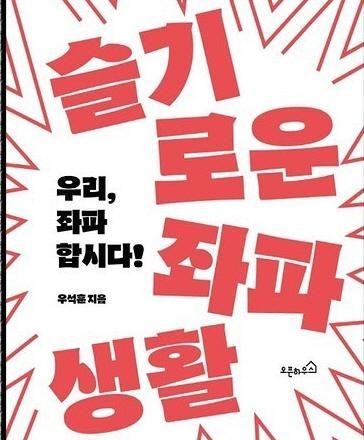(나의 습작은 '생태요괴전'보다 더 기괴한 얘기들의 연속이다...)
나는 왜 글을 쓸까? 가끔 나에게 물어본다. 아주 어렸을 때부터, 글 쓰는 걸 좋아했다. 글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을 처음 쓴 것은 초등학교 6학년 때였던 것 같다. 그 시절에 라디오 듣는 걸 정말 좋아했는데, 라디오 DJ가 말하는 대본 같은 것을 써보기 시작한 게 맨 처음 쓴 글이다. 별 생각 없이 써본 건데, 쓰면서 재밌었다. 그랬더니 갑자기 백일장 같은 데에서 상을 막 타기 시작했다. 그리고는 평생 시간 나면 하는 일이 글 쓰는 일이었다.
내 경우는 글을 쓰고 공부를 한 건 아니고, 글을 쓰다가 공부를 하게 된 경우다. 그래서 무슨 할 얘기가 있어서 글을 쓴다, 이건 사실 뻥이고, 글 쓸 거리를 찾아서 공부를 하게 된 것인지도 모르겠다. 나도 습작을 한다. 그것도 아주 길게 한다. 다른 사람들은 책을 읽고 필사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것 같다. 나는 거꾸로 했다. 책을 읽고, 그런 글을 쓰지 않으려고 노력했다. 성질이 지랄 맞아서 그런 것 같다. 좀 다른 방식으로 쓰고 싶어했던 것 같다. 진짜 지랄 맞은 성격이다.
그리고 어른이 되었다. 이제 진짜로 하고 싶은 얘기들이 엄청나게 많아졌다. 하여간 내가 이해한 한국 사회는, 겁나게 드럽고 아주 지랄이 끝까지 간 사회다. 나는 그 얘기를 잘 못했다. 얘기해봐야, 너만 그렇게 생각한다거나, 사회부적응자라고 할 게 뻔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쓸 얘기가 더 많아졌다. 진짜로 많아졌다. 그리고 사람들은 나에게 죽어라고 글 쓰기를 시켰다. 그리고 자기들은 술 마시러 갔다. 나도 빨리 글을 끝내고 술 마시고 싶었다. 그래서 밤을 새서 글 쓰기를 마치고, 진짜로 술마셨다.
처음에는 기관장들만 따로 보는 글을 썼는데, 나중에는 장관만 보는 글을 쓰거나, 장관의 글을 대신 써주는 일을 했다. 좀 지나니까 대통령 보고서를 쓰게 되었고, 나중에는 아예 총리가 보는 보고서를 쓰는 게 일이 되었다. DJ를 먼발치 말고 직접 본 일은 없다. 어쨌든 그가 내가 쓴 글을 좋아하신다는 얘기는 건네 들었다. 대통령 보고서는 워낙 여러 사람이 관여하니까 사실 누구 글이라고 할 것도 없다. 나는 동료들하고 초안을 잡았을 뿐이고, 그 중의 일부만 내가 썼다. 한 번은 청와대에서 별 의미도 없는 보고서 하나를 나보러 가지고 오라고 했다. 지가 청와대만 청와대지, 뭘 오라가라해, 툴툴거렸지만 상사들은 군말 말고 가라고 그랬다. 용인에서 청와대까지, 그 날이 안 잊혀지는 게, 주차장이 너무 좁아서 돌아 나오다가 차 긁었다. 그 후로는 청와대 갈 때에는 다시는 차 안 가지고 간다. 겁나 툴툴 거리면ㅅ너 갔는데, 보고서랑 자료 주니까, 담당 과장이 내 얼굴 뻔히 한 번 보더니 두고 가라는 거다. 이런 된장, 지가 청와대면 청와대지, 용인에서 광화문까지 심부름을 시켜, 그냥 메일로 보내준다는데… 아주 나중에 건네들었다. 담당자가 글 쓴 사람 얼굴이라도 한 번 보고 싶어했다고. 어쨌든 그 시절의 그 사건이 큰 사건이기는 했다. 그 후로 대통령이 몇 번이나 바뀌었는데, 탄성치 개념을 알고 싶어하고 그걸 이해한 유일한 사람은 DJ였을 것 같다.
그럼 그 시절에 내가 글을 잘 썼느냐? 나중에 그 시절처럼 글을 쓰지 않기 위해서 몇 년을 고생을 했다. 이런 된장, 뭘 좀 써 보려니까 영 보고서체 아니면 찍땡체다. 뭐야 이거? ‘오염된 글’이라는 표현을 쓰면, 그 시절에 내 글이 오염되어 있었다. 뭔 소리인지는 알겠는데, 그야말로 뭔소리인지만 알겠지, 아무 감흥이 없는 글들을 쓰고 있었다.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스케치를 하는데, 내 글은 스케치로 끝이 난다. 공식 보고서 치고는 그래도 여운이 있는 글이기는 한데, 진짜 바짝 메말라 습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글을 쓰고 있었다.
2003년 여름부터 새로 습작을 시작했다. 워낙 무식하게 살아온 인생이라서, 습작도 단순 무식했다. 하루에 A4 10장. 딱 그 기준에 맞추는 일을 하기 시작했다. 그 시절의 필명이 ‘비나리’였다. 주제를 바꾸어가면서 A4 3~4장 정도 되는 글을 매일 발표했고, 그것 말고도 발표 안 하는 글을 1~2개 정도 썼다. 그 습작 기간이 그 후 10년 정도 되는 책들의 원형들이 만들어지는 시기였다. 그 글들을 그냥 자기들이 실을 수 있게 해달라고 브레이크 뉴스와 대자보에서 사람들이 찾아왔다. 그 사람들은, 나보다 더 가난했다. 오후 3시에 만났는데, 아무래도 소주라도 한 잔 사줘야 할 것 같은 느낌이었다. 전골을 시켰던 것 같고, 나는 소주 한 병 정도 마셨던 것 같다. 같이 온 사람 중에 유달리 기뻐하며 소주 두 병을 마신 청년이 있었으니, 그가 변희재였다. 참, 사람 인생 모른다. 그가 태극기 앞에 저렇게 서있을 줄, 나는 진짜 몰랐다.
그 습작기가 1년 정도 간 것 같다. 물론 그 뒤에도 습작 연습은 계속 했고, 아직도 하는 중이다. 2004년 여름에는 책 계약을 하고 원고를 쓰기 시작했다. 그리고 2005년에 두 권의 책을 냈다. 블로그는 책을 내고 나서 열었다. 지금도 나는 습작을 계속 한다. 아직도 나는 어딘가 있는 것, 어쩐지 본 것 같은 글을 쓰고 싶지 않다. 뭐라도 새로운 것을 시도하기 위해, 몸부림을 친다. 같은 것을 계속해서는 내가 견딜 수가 없다.
그 시절의 몸부림이 극한까지 간 책이 <생태요괴전>이다. 생태경제학을 요괴와 흡혈귀 은유를 가지고 쓴 책은 없다. 내가 아는 것을 다 녹여낸다는 마음으로 썼다. 좀 팔렸다. 그렇지만 이 책이 그 후 10년의 내 삶을 결정하는 책이 될 줄은, 그 때는 몰랐다. 이 책을 본 사람들이, 쟤는 영화할 준비가 되었다고 생각했나 보다. 그래서 그 후에 시나리오를 정말로 직업으로 쓰거나 다듬을 수 있게 되었다. 그와는 별도로 영화제에도 초청받아서 가게 되었다. 나중에 내 삶을 돌아보면, 결국 내가 먹고 사는데 큰 불편함을 느끼지 않게 해준 책으로 이 책이 기억날 것 같다. 지금까지는 그렇다. 적절한 시기가 되면 <88만원 세대>로 받은 인세는 청년단체나 시민단체에 기부할 생각이다. 그 생각은 진작에 했는데, 아이들이 연거푸 태어나면서 아직도 실행을… 그래도 꼭 할 거다. 그것도 내 양심이다.
지금 돌아보면, 내 삶의 대부분은 혼자 앉아서 몸부림을 치면서 만들었던 습작들에 있다. 내 습작들은 기괴한 상상, 끔찍한 환상 혹은 전혀 구조화되지 않은 단편, 그런 것들로 구성되어 있다. 지금도 나는 몸부림을 친다. 같은 것을 또 하거나, 익숙한 것을 다시 하지 않는 것, 그게 내 습작의 원칙이다.
내년에 낼 책 중에 농업경제학이 있다. 생태요괴전과 거의 비슷한 시기에 시작을 했는데, 아직도 손도 못 대고 있는. 이제 겨우 한 것은, 일정을 잡은 것이다.
지금까지 해놓은 것은, 이건 편지글로 해야겠다는 정도다. 아빠와 아들의 대화는 이미 쟝 지글러가 <세상의 절반은 왜 굶주리는가>에서 했다. 편지글 습작은 꽤 전에 한 적이 있다. 이 때는 초등학교 6학년이 되는 딸을 설정하고 아빠가 편지보내는 것이었는데, 된장… 딸은 결국 태어나지 않았다.
아직 정확히 아이의 나이를 정하지는 않았는데, 대학교 1학년 정도로 할까 싶다. 내가 사랑하는 둘째가 대학교 1학년이 되었을 때, 아빠가 농업에 대해서 해주는 편지들, 그런 정도로. 진짜 나도, 몸부림을 친다.
'책에 대한 단상'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책으로 먹고 살 수 있을까? (2) | 2018.04.17 |
|---|---|
| 좀 더 전위적인 시도를 위해서 (1) | 2018.04.15 |
| 책과 배달 문제 (0) | 2018.04.11 |
| 이물질 (4) | 2018.04.10 |
| 책에 대한 단상 – 전등사편 (4) | 2018.04.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