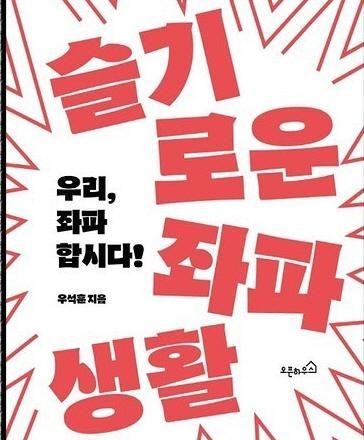에반게리온 Q를 보고 나서
아기 때문에 요즘 영화를 거의 못 본다. 가끔씩 밤에 케이블에서 해주는 영화를 짧게 보는 것이 전부일 정도. 그렇다고 책을 많이 읽느냐… 뭐, 아기가 달려들기를 피하면서 잠시 읽는 정도. 하루에 한 권 읽기도 정신 없다.
에바 얘기를 처음 보기 시작한 건, 서른 살쯤이었던 것 같다. 나는 살기가 힘들었고, 뭘 해야할지도 잘 몰랐고, 그렇다고 하고 싶은 것도 없었다.
뭐… 대체적으로 나는 하고 싶은 것이 별로 없는 것은 마찬가지이지만, 그 때는 특히 더 하고 싶은 게 없었다. 게다가 그 전에는 안 그랬던 것 같은데, 30대 초반이 지나면서 대인기피증이 아주 심해졌다.
다른 우울증은 그 이후로 많이 없어지고, 이젠 왜 그랬는지도 별로 생각이 나지도 않을 정도이다. 그렇지만 대인기피증은 여전한 것 같다. 여전히 혼자 있는 게 편하고, 혼자 생각하는 게 좋다.
아마 일본 80년대와 90년대를 살았던 사람들 중에는 나와 비슷하게, 꽉 짜여진 사회 속에서 그렇게 별로 재미를 느끼지 못하면서, 좀 더 다른 공간과 시간을 상상했던 사람들이 있는 것 같다. 헐리우드의 작법을 따라 편하게 만들어진 4시퀀스 구조를 따라, 혹은 13579로 나가는 플롯을 따라 얘기를 만드는 방법은, 별로 그렇게 재밌게 느껴지지 않았다. 어쩌면 그렇게 많은 돈과 전문적 시스템을 통해서 뭔가 만들 가능성은 아예 없다는 현실적 절망이, 다른 방식의 얘기 전개에 더 매력을 느끼게 했던 것인지도 모른다.
에바 시리즈에는 서로 다른 엔딩이 몇 가지가 있다. 도대체 이게 뭐냐, 그런 혹평을 받았던 극장판의, 그야말로 집단 심리상담 같던 그 엔딩도 좋았다. 나는 누구인가, 전혀 질문은 생략한 채로 지구 평화를 위해서 죽어라고 날아다녔던 아톰에서 수많은 자이언트 로봇들의 얘기, 그런 데에는 존재의 질문은 생략되어 있었다. 사랑과 욕망 혹은 의무감, 그런 것들이 사람을 움직이는 데에 충분했다.
에바에서 던져진 그 질문이 좋았다. 에바 초호기를 타면서 느끼게 되는 신지의 불안과 공포, 도대체 동기는 무엇인가, 그렇게 계속 던져지는 질문이 좋았었다.
극장편에는 조금 다른 결론들이 있었고, 더 전격적이며 더 현실적인 엔딩들이 있었다. 그런 것들 것 나름대로는 좋았다. 도대체 왜 그렇게 수많은 다른 엔딩들이 필요할 것인가, 이해할 수는 있을 것 같았다. 그렇지만 일관되게 얘기를 이해하고 싶은 사람들에게, 열린 결론들로 계속해서 끌어나가는 수 많은 다른 엔딩이 고통스러울 수도 있을 것 같다.
에반게리온 Q는 앞에 나온 서, 파와는 달리 그 후의 얘기를 하고 있다. 어떻게 보면 TV판이 처음 공개된 후, 처음으로 서드 임팩트 이후의 얘기를 한 것이다. 그 이후로 14년이 흘렀는데, 그냥 구경만 하던 내 삶도 그새 15년이나 흘러갔다. 그 사이에 나에게 어떤 변화가 생겼을까, 나도 질문을 해보지 않을 수 없다.
신지가 14년 동안 잠들어있으면서 아무 것도 변하지 않은 것처럼 나도 과연 그런 것일까? 아니면 정말로 뭔가 본질적인 변화가 생겼는가?
글쎄, 그런 복잡한 건 잘 모르겠다. 그 때나 지금이나, 내가 뭘 하고 싶은지, 여전히 잘 모르겠고, 뭔가 꼭 하고 싶다는 욕망 같은 것도 여전히 없는 듯 싶다. 만약 차이가 있다면, 그 때는 민중들을 위해서 뭔가 해야 한다는 의무감 같은 것은 좀 있었던 듯 싶은데, 아주 솔직히, 요즘은 그런 의무감도 잘 없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때도 아침에 일어나면 뭘 해야할지 잘 몰랐는데, 요즘도 잘 모른다는 것. 해야할 일들의 리스트는 있지만, 그걸 꼭 오늘 해야 하는지, 아니면 지금 해야 하는지, 그런 것도 잘 모르겠다는 게 여전히 같은 듯싶다.
사는 집은 좀 바뀌기는 했는데, 어쨌든 그 때도 집이 있었고, 지금도 집이 있었고… 당시는 내 방에서 편하게 담배를 피웠는데, 지금은 그럴 수 없다는 것, 억지로 찾으면 그 정도 차이가 아닐까 싶다.
그럼 도대체 지난 15년 동안, 도대체 난 뭐를 한 거야? 신지처럼 잠자고 있었던 거야?
그 때도 내가 지켜줄 수 없는 사람들 생각하면서 괴로웠다. 그리고 그건 지금도 마찬가지인 것 같다.
좌파로 살다 보면, 동료들을 지킬 수 없는 순간들이 종종 오게 된다. 평생 초등학교 동창회부터 다 챙기면서 살아가는 사람들과는 좀 다르게. 같이 일하던 팀이 깨지고, 동료들이 뿔뿔이 흩어지고, 그걸 무기력하게 보고 있어야 하는 순간들이 종종 온다.
그런 일을 다시는 겪지 않겠다고 몇 번이나 결심을 했지만, 시간과 공간을 달리하며 마지 데쟈뷰처럼 그런 일을 겪게 된다. 그러면 다시 무기력한 생각에 치를 떨면서, 다시 방안에 틀어박혀 아무도 만나지 않고 지내는…
그러면 팍 그만두거나 팍 떠나버리면 될 거 아냐… 예전처럼 그냥 외국으로 나가버릴 만한 그런 힘도 용기도 없다는 데에 사태의 어려움이 있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나이를 먹으면 늘어난 뱃살만큼 새로운 것에 대한 두려움이 같이 많아진다. 좋게 해석하면 안정감이지만, 뭐, 의욕상실과 용기 감소, 그런 것 아니겠나 싶다.
하여간 이런 불안감 속에서 아무 것도 하지 않고 6월을 보냈다. 뭐, 6월이 다간 건 아니다. 이제 막 절반이 지났을 뿐이니…
어쨌든 좋든 싫든, 이번 주부터는 새로운 방송의 촬영이 시작되고, 성과가 있든 없든,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움직여나가게 될 것이다.
에반게리온 파는 2편으로 나누어져, 이번에 본 것은 전편이다. 에바의 세계에서는 진작에 나온 줄 알았는데, 여전히 나는 그 안에서 나오지 않고 있는 듯싶다.
'영화 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영화 <베테랑> 감상문 (1) | 2015.07.23 |
|---|---|
| 머니볼, the show (7) | 2014.02.19 |
| 추억을 곰씹는다 (1) | 2012.12.01 |
| 데이브레이커스 (5) | 2012.11.04 |
| KU 시네마테크 (1) | 2012.07.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