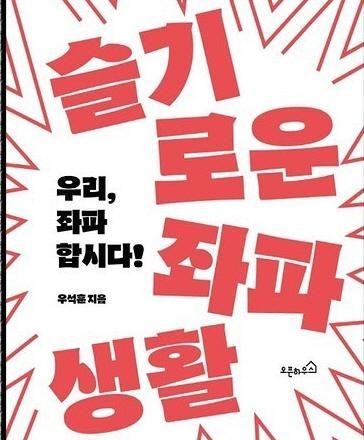신년이다. 무겁지 않은 책을 골라봤다.
출간 중간에 순서가 바뀌기는 했지만, 실제로 내가 제일 처음 쓴 책은 음식 책이었다. <음식국부론>, 내가 제일 자신있는 얘기로 제일 처음 집어든 주제였다. 나름 선방을 했고, 나중에 <도마 위에 오른 밥상>으로 제목이 바뀌었고, 문고판도 나왔다.
요즘도 음식 책을 종종 읽는다. 제이미 올리버를 으뜸으로 친다. 그게 모티브가 되어 올해 낼 농업경제학을 재구성하는 하는 중이다.
음식만 들여다보고 있으면 그 나라의 문화는 물론이고 경제도 보인다. 그리고 집권층이 어떤 사람인지도 보인다.
이해림의 <탐식 생활>은 음식 책으로만 국한해서 보자면, 가장 정직한 책이다. 그리고 '사카린' 없는 책이다. 화려하지는 않다. 그래서 믿고 볼만한 책이기도 하고.
레시피를 중심으로 만들어지는 많은 책 중에서는 좀 그런 책들이 많고, 특히 아이들 이유식 책 중에는 "미친 거 아냐", 그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 책들도 많다. 애들 입에 사카린을 털어넣는 듯한 느낌을 받게 만드는.
음식은 자본주의 현상이고, 권력 현상이다. 그래서 분석할 가치가 있고, 여전히 미래적 가치가 있다.
이해림의 책은 그 밑재료에 관한 가장 우수한 책 중의 하나다.
이 시점에서 당연한 반론이, 그럼 소박한 밥상은?
우리는 대개 탐식생활과 소박한 밥상 사이에서 살아간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일상은 정크 푸드로 구성된다. 어쩔거냐? 가끔은 탐식도 필요하다. 그래야 맛을 잊지 않고, 진짜 음식을 정크 푸드 사이에서 가려낼 수 있게 된다. 그럼 돈은?
그건 정부에 주장할 얘기다. 우리도 탐식생활 좀 하게, 소득 좀 보장해주라..
'남들은 모르지.. > 책 서문 읽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서문 읽기 6] 위기의 경제학? 공동체 경제학! - 최배근 (0) | 2019.01.03 |
|---|---|
| [서문읽기 5] 박용진의 경제민주화 분투기 (0) | 2019.01.02 |
| [서문 읽기 3] 오늘은 좀 매울지도 몰라 (0) | 2018.12.31 |
| [서문 읽기 2] 어른에게도 어른이 필요하다 (3) | 2018.12.30 |
| [서문 읽기 1] 전력 네트워크 (5) | 2018.12.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