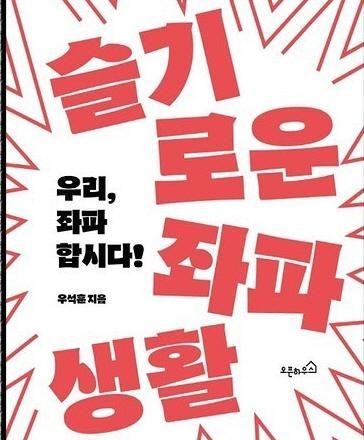직장 민주주의 4장은 '젠더 민주주의'라는 제목을 달았다. 직장 민주주의 하부 범주. 원래는 이 한 장만 가지고 '젠더 경제학'을 별도로 쓸 구상이 있었는데, 갑자기 직장 민주주의를 쓰게 되면서... 밀도를 높여서 장 하나에 책 한 권을 녹여넣기로.
젠더 경제학이라는 이름을 처음 접한 건 95년이다. 박사 논문을 내고 심사까지, 너무 유명한 심사위원들이라서 시간 조율에 1년이 걸렸다. 그 사이에 별로 할 일이 없었다. 그래서 한 번도 들여다보지 않은 주제들을 넓게 돌아본 일이 있었다.
urbanism이라는 주제를 그 때 처음 보았다. 요즘 내가 얘기하는 탈토건의 기본 정서가 그 때 형성되었다. 도시에 생겨나는 온갖 기현상들. 그 와중에 gender 경제학도 유심히 보았던 주제였다. 이게 뭐지?
지금 와서 돌아보니까 내가 밥 먹고 살게 된 많은 주제들이 박사 논문 제출하고 나서, 할 일 없으니까 도서관에서 죽치고 앉아서 봤던 것들에서 나오게 된 셈이다. 박사 논문 쓸 때까지 나도 정규 교육과정에 비교적 충실하게 공부했었다. 내 생각이 다양해진 것은, 박사 논문 내고 달리 할 일도 없어서 그 때까지 봤던 것과는 전혀 다른 주제들을.
책이 안 팔린다고 사방에서 난리고 곡소리다. 내 책도 그닥. 그래도 어디 가서 책 안 팔린다고 말도 못한다. 평균 내보니까 최근에도 책 인세랑 생활비랑 그럭저럭 똔똔. 아무 생각 없이 인세가 딱 생활비 만큼이라고 했다가, 진짜 돌 맞아 죽을 뻔 했다. 인문 특히 사회과학에 그런 사람은 없다고... 술값 다 내고 가야 하는 분위기였다.
'젠더 민주주의'라는 제목에는 내 양심이 달렸다. 1995년 여름, 그 때도 더웠다. 파리에서 많은 사람들은 휴가 갔는데, 나는 박사 논문이 마무리된 것만으로도 너무 좋아서 따로 휴가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다. 물론 도니도 없었고. 그 때 한적하게 쌓아놓고 읽던 책 중에서 젠더 고민을 처음 시작해보던. 그 때 생각이 난다.
a4로 10장을 넘기지는 않을 생각이다. 내가 생각하는 기업과 젠더에 대해서, 이제는 결론을 내야 한다.
하이고 덥다. 내 방은 얄짤 없이 35도다. 나는 오늘도 혼자서 진도 나간다. 이런 삶이 나는 좋다. 아마도 언젠가 이 시간을 돌아보면서, 무의미하게 살았다고 하지는 않을 것 같다.
내 삶이라는 게, 별 거 없다. 떼돈 버는 것도 아니고, 무슨 엄청난 권세가 있을 것도 아니고. 사람들이 얼굴 알아보는 것도 싫다. tv에는 진짜 최소한만 나간다. tv 한 번 잘 못 나가면 한동안 일상이 힘들어진다. 아무도 나를 모르고, 신경 쓰지도 않고, 그런 상태 딱 좋다.
그렇지만 나는 진도 나간다.
한국을 사랑한다는 사람을 종종 보았다. 대부분 개구라다. 한국을 굳이 '대한민국'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의 한국 사랑은, 새빨간 거짓말인 경우가 많다. 대부분, 그들은 돈을 사랑한다. '대한민국'은 돈을 벌게 해주는 수단일 뿐이고.
나는 아직도 지금 보다 나은 한국 사회를 기다린다. 그 희망을 포기한 적은 없다. 노회찬이 사라진 지금, 그 희망은 조금 더 간절해졌다...
'남들은 모르지.. > 직장 민주주의'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재밌는 일 vs 돈 되는 일 vs 보람 있는 일 (0) | 2018.08.10 |
|---|---|
| 직장 민주주의, 후반부로 향하면서 (0) | 2018.08.04 |
| 직장 민주주의, 2부 구조.. (0) | 2018.07.20 |
| 오너 리스크 (0) | 2018.07.17 |
| '선배, 후배, 군대냐, 조폭이냐 (0) | 2018.07.09 |